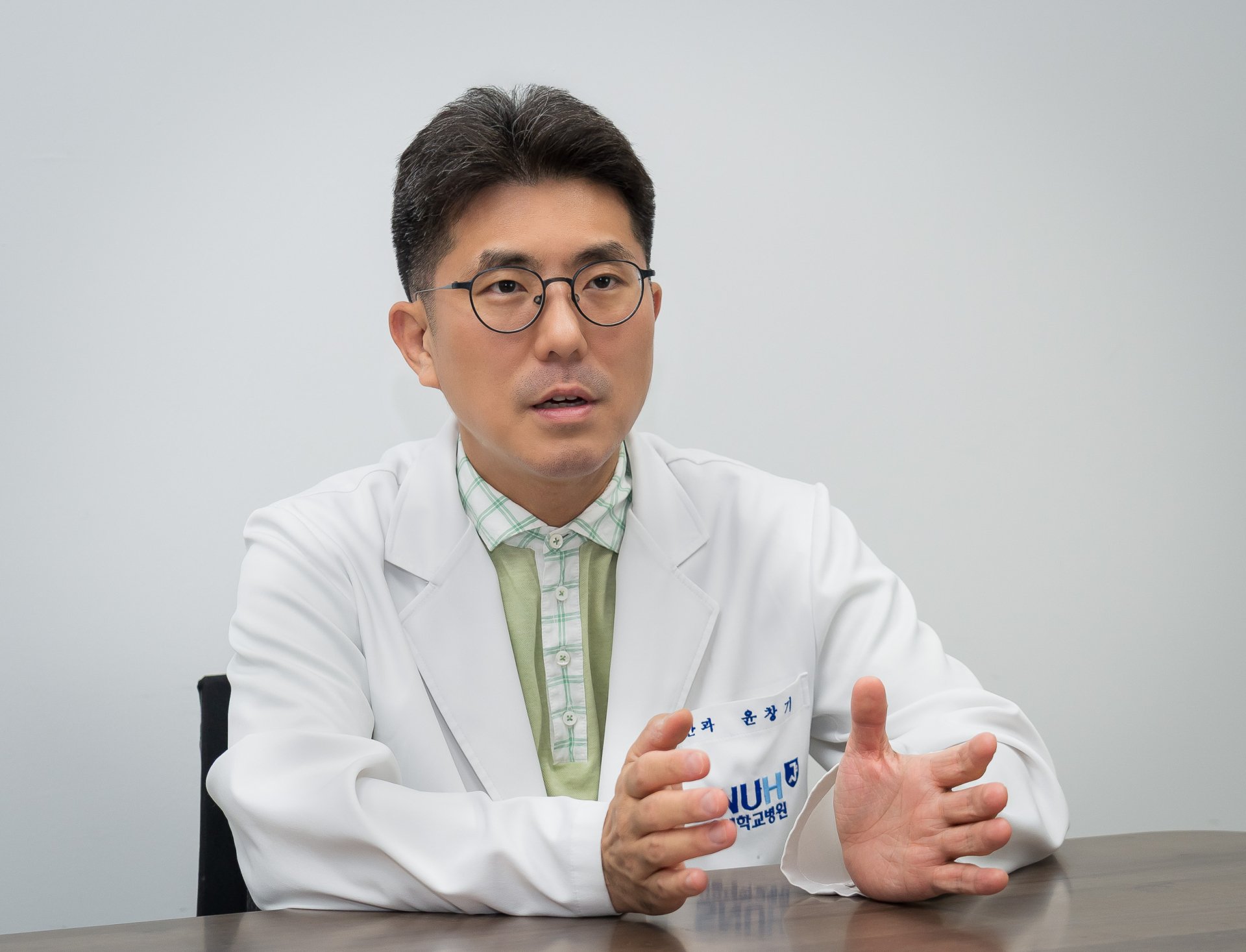이른 새벽,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거리를 구하기 위해 인력시장에 모여드는 풍경은 현대 도시의 익숙한 장면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도 이와 유사한 생계 수단이 존재했다. 극심한 궁핍 속에서 스스로를 ‘노비’로 팔았던 사람들의 계약서, ‘자매문기(自賣文記)’가 그것이다.
경북 안동시 한국국학진흥원은 조선후기 작성된 자매문기 15점가량을 소장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자매문기는 기근, 홍수, 질병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서민이 생존을 위해 스스로를 남의 집 노비로 팔겠다는 내용이 담긴 일종의 법적 계약서다. 오늘날 하루 단위의 고용계약과 달리, 평생 노동력과 자손까지 소유주에게 귀속시키는 조건이었다.
대표적 사례 중 하나는 1815년 대기근 당시 안동의 한 청년 윤매(允每)의 자매문기다.
문서에는 “가까운 친족도 없고, 아버지는 객지에서 굶어 죽었다. 장례를 치를 여력이 없어 저를 팔겠다”는 절절한 사연이 담겨 있다.
윤매는 30냥(현 시가 약 240만원 상당)에 자신과 후손들이 대대로 노비가 되겠다고 약속했고, 글을 모른 윤매는 왼손바닥을 종이에 찍어 서명 대신 삼았다.
또 다른 사례인 윤심이(尹心伊)의 문서도 눈길을 끈다.
남편은 이미 남의 집 노비로 들어간 상황에서, 80세가 넘은 시부모를 모시며 아들과 함께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던 윤심이는 스스로와 아들 복이(卜伊)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자 했다. 이에 관청은 “형편이 그러하니 허락한다”는 공식 문서를 내려 사실상 공증 역할을 했다.
자매문기는 계약서(자매문기) 외에도 청원서(소지), 관청의 승인 문서(입안)로 구성된다. 이는 현대의 계약서에 공증 절차를 덧붙이는 법적 효력과 유사하다.
한국국학진흥원 관계자는 “자매문기는 단순한 계약문서를 넘어, 조선 후기 신분제의 붕괴와 사회 구조의 변화를 보여주는 귀중한 사료”라며 “노비에서 양민으로의 신분 상승이 활발해지면서, 동시에 스스로 다시 하층민이 되려는 자매문기가 다수 등장한 것도 이 시기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