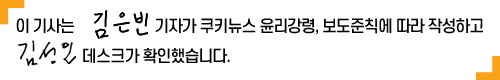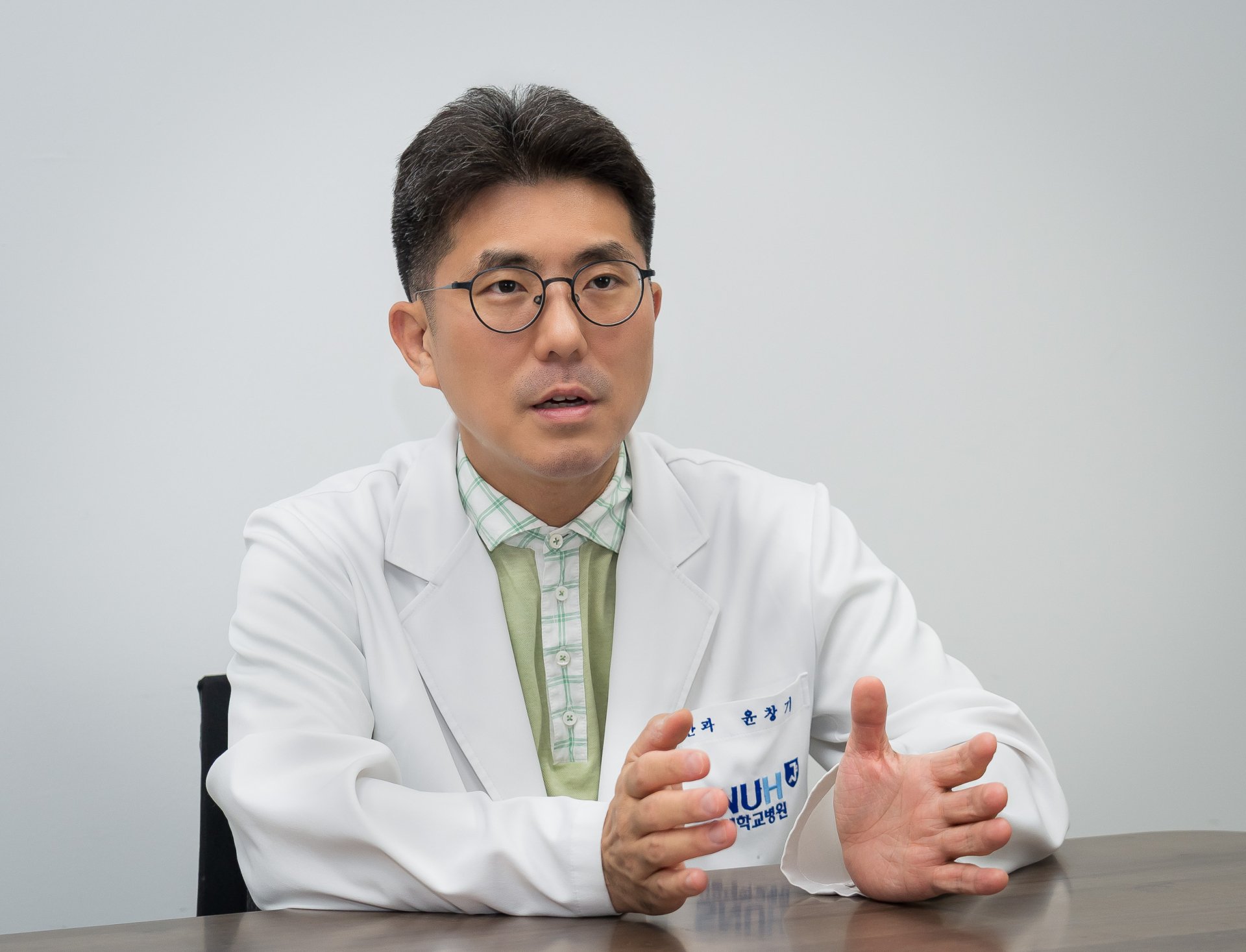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법정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 되는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4세까지 늘리면 1인당 급여액이 높아져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연금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추가적인 재정 안정화 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李 법정 정년 연장 공약에 연금 가입연령 상향 목소리 커져
2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은 18~59세만 가입이 허용된다. 반면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1953~1956년생 만 61세, 1957~1960년생 만 62세, 1961~1964년생 만 63세, 1965~1968년생 만 64세,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다.
보험료는 59세까지 내는데, 연금액은 65세부터 받기 시작해 6년 정도의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 1998년 연금개혁에 따라 수급연령을 5년마다 한 살씩 늦추는 조치를 취했지만, 가입연령은 만 59세로 고정된 탓이다. 연금을 받기 직전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는 대부분의 국가들과 달리 한국은 6년의 구조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진 만큼 60세 이후 가입연령 제한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현재 정년이 60세인 점을 고려할 때 연금 수령 나이인 만 65세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노후소득 불안이 큰 상황이다.
이 정부의 정년 연장 추진과 함께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향 논의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해 “연금 수급 시기 고려했을 때 올해 진행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잘 논의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입기간 5년 연장은 복지부가 지난해 9월 내놓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포함돼 있다.

국민연금 64세까지 내면 급여액도 늘어난다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늘어나면 가입자들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가입 연령과 수급 연령 조정의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가입연령이 수급연령까지 연장될 경우 전체 가입자 수 증가로 이어져 전체 보험료 수입이 확대된다. 또 연금 수급 자격을 취득하는 인구를 증가시켜 수급 개시 시점의 연금액 수준이 상향된다.
보건복지부가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추산 자료에 따르면 1969년생 평균 소득자가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경우 총 보험료는 1억2053만원, 받아가는 생애 총 급여액은 4억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상태에서 가입기간을 5년 늘리면 총 보험료는 1억4278만원으로, 생애 총 급여액은 4억3663만원으로 늘어난다. 5년 더 납부할 경우 급여액을 약 3000만원 이상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자료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0%로 가정한 시나리오다.
다만 국민연금 재정적 측면에서는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로 가정했을 때 수급 연령은 65세로 그대로 두고 가입연령만 64세로 조정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1년 앞당겨진다.
김혜진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입자 수 증가와 이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는 연금 재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가입자의 가입 기간이 늘면서 1인당 급여액이 높아져 증가한 급여지출이 연금 재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납부기간을 늘려야 한다며, 재정 안정화 조치는 별개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쿠키뉴스에 “정년 연장 뿐 아니라 60대 전반기의 고용률이 높기 때문에 의무가입 연령 상향은 꼭 필요하다”라며 “가입기간을 늘려 국민연금 급여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수급액 증가로 인해 재정적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재정 안정화 조치는 결국 수지 균형의 문제다”라며 “2차 안정화 개혁을 통해 이뤄져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