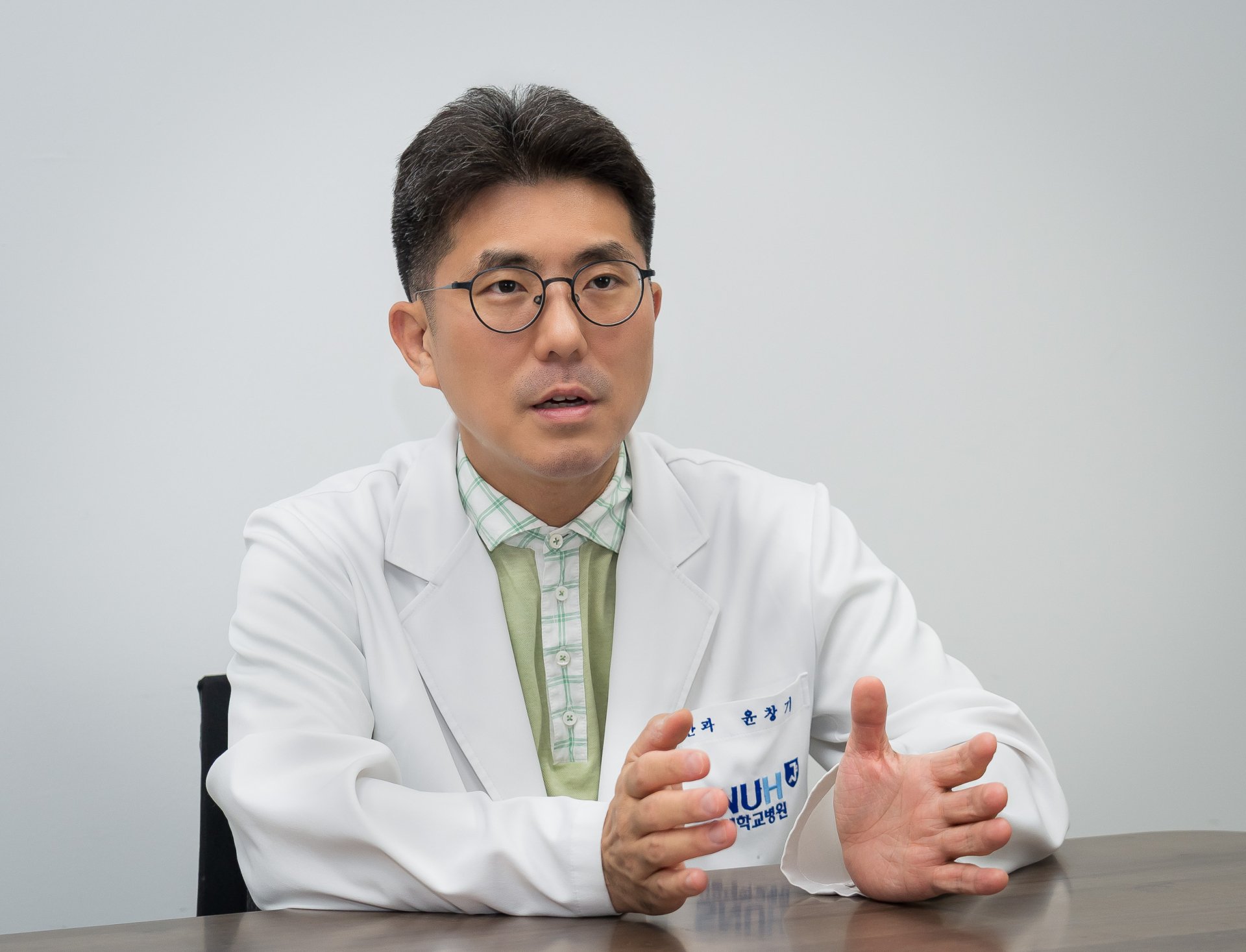[쿠키 문화] 이탈리아 중부 산악도시를 강타한 지진으로 수백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지난 6일 새벽의 아비귀환은 공교롭게도 신인 작가 김유진(28사진)의 첫 소설집 ‘늑대의 문장’(문학동네)에 수록된 ‘움’이라는 작품에 고스란히 옮겨져 있는 듯 하다.
“그가 시장 입구에 막 들어섰을 때 큰 굉음과 함께 빛이 번쩍였다. 천둥소리가 지반을 울렸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러자 땅이 갈라졌다. 그는 갈라진 틈에 손을 끼우고 가자미처럼 엎드렸다. 지진은 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것 같았다.”(137쪽)
김유진 소설은 지진 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재앙을 소재로 삼으며 종말론적 분위기를 자아낸다. 왜 그는 재앙에 천착하는 것일까. “극단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재앙이나 멸망이라는 소재가 매혹적으로 다가왔지요. 긴박한 재앙의 상황 속에도 항상 존재하는 고요하고 정적인 순간들을 포착하고 싶었습니다.”
지뢰를 밟고 사람의 몸이 한순간에 폭발해버리는 끔찍한 사건이 전염병처럼 번지는 재앙을 그린 표제작은 2004년 문학동네 신인상 수상작이기도 하다. 소설은 개와 함께 있던 세 쌍둥이 여자아이들의 느닷없는 폭사 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자리엔 단무지처럼 얇은 다리와 덜 자란 내장이 흩어져 있을 뿐이었다”라는 문장은 어떤 감정 개입도 배제된다. 마을 사람들은 규명할 수 없는 폭사의 원인을 피칠갑을 하고 돌아다니는 늑대떼에게 돌린다. 버려지고 굶주린 개들은 늑대가 돼 마을에 또 다른 재앙이 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도 늑대와 다를 게 없는 존재로 전락한다. 마지막 문장은 개와 늑대와 사람의 구별이 불가능해진 재앙의 마을에서 겨우 살아남은 소녀의 시선을 담고 있다. “지상의 무덤들은 빠른 속도로 퇴적되고 그 위로 아무렇지 않게 나무가 자랄 것이었다. 그리고 그 무성한 숲속에서 늑대가, 온전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유일하게 어둠을 지킬 것이라고 소녀는 굳게 믿었다.”(34쪽)
재앙의 한가운데에서, 또는 살짝 비켜서서 이를 기록하고 전수하는 존재들이 소설 곳곳에 등장하는데 이는 재앙의 시대를 기록하는 김유진 자신의 대체적 존재다. “언니는 물속으로 사라진 머나먼 이국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오래전 언니가 나에게 들려주었고, 또 내가 다시 언니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였다. 우리의 이야기가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것만 같았다.”(‘목소리’)
소설속 ‘언니’와 ‘나’로 이어지는 이야기 전수자가 바로 소설가라는 사실을 이 젊은 작가는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재앙의 순간, 사멸하거나 침묵해버린 자리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는 소설가가 김유진이다. 소설적 소재의 재앙에서 살아남겠다는 작가의 각오가 이 소설집에 들어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철훈 기자
▶뭔데 그래◀조혜련 '기미가요' 박수…무개념인가, 무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