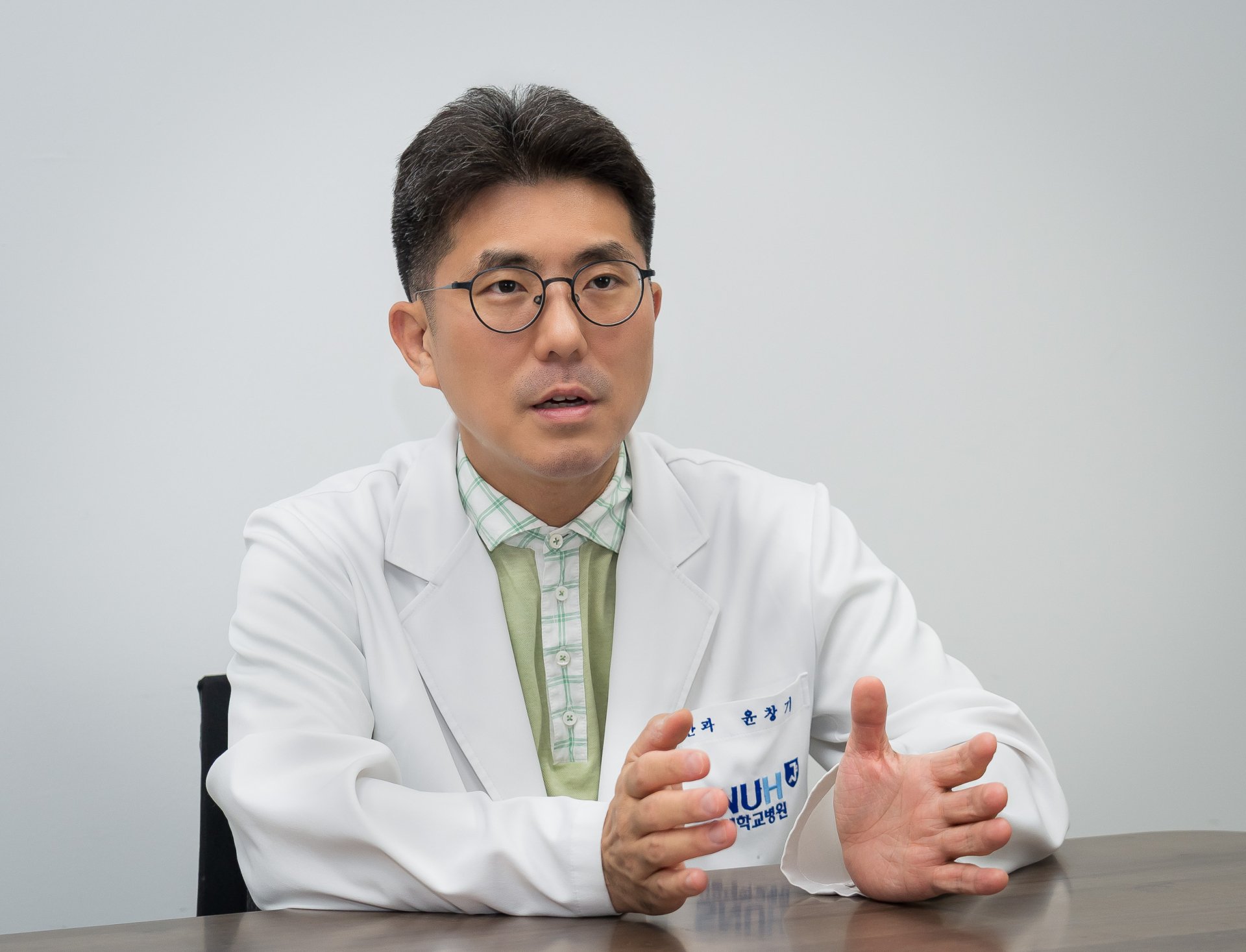‘외로움 없는 서울’, 줄여서 ‘외없서’. 서울시가 내건 이 슬로건을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어색함이 앞섰다. 외로움이라는 지극히 내밀하고 주관적인 감정을 행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낯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의 자살률이 OECD 평균의 1.8배에 달한다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이 낯선 시도는 더 이상 그저 어색함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절박한 과제가 되었다.
서울시가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외로움 없는 서울’ 정책의 핵심은 기존 복지 패러다임과 차별화된다. 경제적 빈곤이나 질병이 아닌, ‘외로움’ 그 자체를 공적 개입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는 외로움을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공공의 문제로 인식하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전국 최초로 설립된 ‘고립예방센터’가 운영하는 24시간 상담 전화 ‘외로움 안녕120’이 대표적이다. 화재신고 119, 범죄신고 112에 이어 외로움 신고 120이 등장한 것인데, 이것은 외로움을 개인적 감정이 아닌 사회적 응급상황으로 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외로움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 전, 예방과 치유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의지다.
물론 정부가 시민의 내밀한 감정 영역까지 관리 대상으로 삼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심리적 문제를 일종의 상품처럼 취급하는 접근법에 대한 우려 역시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관점을 조금 달리하면, 이는 단순한 행정 서비스의 확장을 넘어 진화한 사회 안전망의 구축이자 실험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국가는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안전, 교육, 고용 등 다양한 영역을 제도 관리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사회와 분리되지 않고 소속감을 가질 권리 또한 그런 측면에서 공공의 영역으로 다룰 수 있다.
특히 1인 가구 비율이 34%를 넘어선 서울의 현실에서, 고립과 외로움은 더 이상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이다.
외로움을 정책 의제로 다룬 선례는 이미 해외에서 있었다. 영국이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부‘를 신설한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단순히 조직 신설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서비스 인프라 구축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134개 시설에서 운영되는 ‘서울형 정원처방’, 독서로 치유를 시도하는 ‘마음여행 독서챌린지’, 그리고 외로움 당사자가 직접 상담사로 참여하는 ‘서울마음편의점’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서울시의 ‘외없서’ 정책이 주목받는 진짜 이유는 우리 사회가 이미 충분히 외로웠기 때문이 아닐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친 청년층은 물론, 사회적 관계로부터 고립된 노년층까지 모두 각자의 외로움을 키워왔다.
서울시가 시민들의 외로움을 모두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적어도 외로움을 혼자 견뎌내지 않아도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는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외로움을 느끼는 시민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적 연결망을 복원하려는 서울시의 실험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이제 막 발을 뗀 서울시의 실험이 성공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우리는 더 이상 외로움의 무게를 개인에게만 떠넘길 수 없다는 사실이다. 서울시의 새로운 시도가 우리 사회 전체의 외로움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