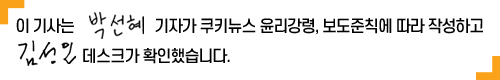비급여 진료비 증가로 인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꼭 필요한 비급여를 선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2일 국회도서관에서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한 비급여 관리 방안’을 주제로 열린 ‘2025 쿠키뉴스 건강포럼’에서 “한국은 과거 의료 접근성이 좋은 나라로 꼽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같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며 “보편적 의료보험 제도를 갖췄지만 해외에 비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아 개인 부담이 커지고 건강보험 재정이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한국은 보험 재정과 함께 가계직접부담 비율이 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건복지부 등이 공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 대비 정부·의무가입보험 재원 비율은 64.1%로 OECD 평균(75.6%)에 못 미친다. 가계직접부담 비율은 28.8%로 OECD 평균(19%) 대비 한참 높은 수준이다. 건강보험 보장률도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2017년 62.7%였던 보장률은 2019년 64.2%로 소폭 상승했으나 2020~2023년 사이 64~65%를 유지했다.
비급여 진료비 증가는 건강보험 보장률 정체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처방 비중이 보장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지난 2022년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비급여 수술이 줄었는데, 이 시기에 건강보험 보장률은 상승했다. 반대로 2023년 비급여 독감 주사제 처방이 증가한 뒤로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늘었다.
요양병원의 비급여 급증도 문제로 지적된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요양병원 암 환자의 비급여 진료비는 151.8% 확대됐다. 해당 비급여 항목 중 67.4%는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면역보조제 등 비필수적 치료 영역이었다. 서 실장은 “암 전문 요양병원이 늘어나면서 면역주사 같은 비급여 처방 사례가 많아지고, 실손보험 활용이 커졌다”며 “실손보험을 통해 의학적 필수성이 낮은 비급여 항목이 주로 처방되면서 과다 진료와 오남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의료 사각지대에 머무는 이들이 적지 않다. 현재 국내 실손보험 가입률은 소득과 연령에 따라 큰 격차가 있다. 2022년 기준 70대 이상 고령층의 실손보험 가입률은 27.6%에 불과하다. 40대(82.3%)나 50대(77.9%)에 비해 현저히 낮다. 서 실장은 “경제적 여력이 부족할수록 실질적 의료비 부담이 무거워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서 실장은 “여러 정책이 제시됐지만, 행위별 수가제와 상급종합병원 중심 의료 전달체계가 여전히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사용을 부추기고 있다”며 “비급여 항목을 분류하고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2023년부터 비급여 진료비 표준화를 구축하고 비급여 정보를 공개하는 등 분류 체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 실장은 “비급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평가해 불필요한 항목은 퇴출하고, 필요한 부분은 단계적으로 급여화해야 한다”라며 “실손보험도 적정 의료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합리적 보장 범위에 대한 논의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